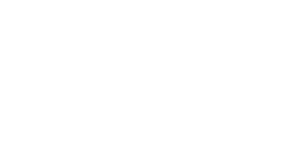[비즈한국] 1960~70년대 아폴로 미션의 우주인들이 달에서 암석과 흙먼지를 갖고 돌아온 이래로, 지구 바깥 우주를 떠도는 천체에 착륙해서 직접 그곳의 물질을 갖고 돌아온 사례는 지금까지 딱 두 번이 있다. 두 번 모두 지구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소행성이었다.
한 번은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시도했던 류구 소행성이고, 또 하나는 NASA의 오시리스-렉스(OSIRIS-Rex) 탐사선이 방문했던 소행성 베누다. 두 탐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착륙이라기보다는 소행성 표면에 잠시 쿵 하고 접촉하고 돌아왔다. 소행성 표면에 터치다운을 하는 순간 튀어 날아간 파편을 수집해서 캡슐에 담았고, 그것을 싣고 무사히 지구에 돌아온 것이다. 소행성에 ‘벨튀’를 하고 돌아온 셈이다.
오시리스-렉스는 2020년 10월 20일 베누에 접촉해 샘플을 수집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24일 샘플을 실은 캡슐이 무사히 지구 대기권을 뚫고 돌아왔다. 지구에 갖고 온 베누의 샘플은 총 121.6그램이다. 이것은 지구로 회수한 가장 많은 양의 소행성 샘플이다. 그리고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흙먼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DNA와 RNA의 모든 재료가 발견된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베누가 원래는 훨씬 큰 행성, 생명을 품고 있던 행성이 부서지고 남은 파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탐사선을 직접 보내기 전까지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베누도 지극히 평범한 소행성이라 생각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들에서는 광물들이 둥글게 굳은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알갱이를 뜻하는 ‘콘드룰’이라고 부른다. 정확한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태양계 형성 초기 강렬한 태양 빛에 녹은 광물들이 다시 굳으면서 만들어진 모습으로 추정한다. 이런 동그란 콘드룰의 형태는 아주 많은 소행성과 운석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탐사선이 방문해서 확인한 베누의 상황은 예상을 벗어났다. 베누의 암석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콘드룰이 잘 보이지 않았다. 베누는 화학적으로 더 다이내믹한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베누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바로 물이다.
물은 암석, 광물의 성질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재료다. 베누의 샘플에는 물에 의한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산마그네슘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산염과 규산염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동시에 생명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 중 하나인 탄소와 질소도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베누가 단순히 우주 공간을 떠돌던 소행성 돌멩이가 아니라, 원래는 바다를 품고 있던 덩치 큰 행성에서 떨어져나온 조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분석에서는 총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 14가지가 검출되었다. 아미노산이 길게 이어지면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이 한 소행성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게다가 질소를 머금은 채 고리 형태로 이루어진 분자, N-헤테로사이클이 매우 압도적으로 많이 검출되었는데, 그 밀도가 5nmol/g 정도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앞서 분석이 이루어진 류구와 같은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면 5~10배가량 더 높다. 특히 지구 생명체의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질소 염기–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까지 모두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니콘틴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자들이 검출되었다.
베누는 단순히 탄소 흙먼지를 머금은 돌맹이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생명의 재료, 생명 물질을 머금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떨어져나온 조각처럼 보인다.
베누 샘플에서는 소금기, 염분을 머금은 작은 결정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베누가 원래 아주 짠 바닷물, 소금 호수를 머금었던 환경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베누에서 검출된 성분은 지구의 호주 등에서 발견되는 소금 호수와 매우 비슷하다. 이를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원래 베누가 아주 짠 소금 호수를 품고 있던 모행성에서 떨어져나간 조각일 거라는 가설에 힘을 싣는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베누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또는 가장 큰 왜소행성 중 하나인 세레스와 비슷하다. 어쩌면 둘 중 한 곳이 베누의 원래 고향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베누는 지름이 500m밖에 안 되는 작은 소행성이지만, 원래는 그보다 훨씬 큰 원시 행성 또는 왜소행성 정도는 되었을 거라 추정한다. 그 표면 또는 지하에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바닷물과 호수가 존재했고, 어쩌면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다양한 유기 분자와 질소 염기까지 가득 품고 있던 세계였다. 그러다가 약 20억~7억 년 전에 크기가 비슷한 또 다른 행성체와 격렬하게 충돌해 결국 모행성이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조각 중 하나가 지금의 베누로 추정된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현재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를 돌면서 화성과 1:2 공명을 이루는 소행성 폴라나가 베누의 모행성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베누의 모행성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일찍이 격렬한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위에서도 지구처럼 다양한 생명이 탄생했을지 모른다. 지구도 지난 45억 년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겪었고, 그 중에 몇 번은 생태계 일부가 싸그리 사라질 정도의 위력이 있었지만, 다행히 행성 자체가 파괴될 정도의 충돌은 피했다. 반면 베누는 행성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충돌을 경험했고, 결국 잠깐의 찬란했던 추억을 품은 조각들만 남은 채 태양계 외곽을 떠돌게 되었다.
만약 베누가 운좋게 당시의 충돌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태양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두 행성에서 각자 진화한 두 생태계, 그리고 두 문명이 비슷한 시기에 서로를 발견하고 침략하고 교류하며 일찍이 다중 행성 종족의 삶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다.
베누 샘플에서 다양한 생명 물질을 발견한 것은 또 다른 소행성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태양계 공간 안에만 생명 물질이 아주 널리, 많은 곳에 퍼져 존재할 거라는 뜻이다. 미세한 형태로나마 어딘가에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소행성이나 혜성 등 태양계 외곽을 떠도는 작은 소천체에서 지구 생명의 기원에 실마리가 되는 유기물, 아미노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여러 탐사를 통해, 지구 바깥에 생명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물질이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역사상 처음 혜성에 착륙을 시도했던 로제타 미션이 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은 귀여운 러버덕 모양의 67P 혜성에 착륙했는데, 혜성 표면에서 기대했던 지구 바닷물의 기원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아미노산 글리신이 검출됐다. 이는 지구 생명의 기원이 지구 바깥에서 왔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 베누 샘플 역시 지구 생명이 단순히 지구가 아니라 머나먼 우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도 품고 있다. 오래전 태양계에서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벌어질 수 있는 무대로 지구가 유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 말고도 다양한 행성, 심지어 오래전에 충돌과 함께 산산조각 나서 사라진 추억 속 원시 행성들에서도 흔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태양계에서는 생명의 재료가 매우 흔했고, 지금도 흔하다. 베누 한 곳에 이렇게 높은 함량의 생명 물질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또 다른 많은 소행성에서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고대 생명의 잔재들이 태양계 외곽을 떠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탐사를 통해 베누의 잃어버린 조각을 하나둘 찾아내면서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또 다른 생명의 보고를, 깨진 도자기 조각 맞추듯이 추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베누라는 작은 소행성과 거기서 가져온 캡슐 속 흙먼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수십억 년 전 사라진 거대한 또다른 행성을 떠올린다. 어쩌면 호수와 바다를 품고, 생명까지 창발했을 모습을.
참고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0-024-02472-9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8495-6
필자 지웅배는? 고양이와 우주를 사랑한다. 어린 시절 ‘은하철도 999’를 보고 우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및 근우주론연구실에서 은하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를 연구하며, 강연과 집필 등 다양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썸 타는 천문대’, ‘하루 종일 우주 생각’, ‘별, 빛의 과학’ 등의 책을 썼다.
지웅배 과학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사이언스] 에너지 토해내는 '펄사'가 외계문명의 에너지원?
·
[사이언스] 우리 은하 중심에서 '삼체' 현상 포착
·
[사이언스] 제임스 웹 이후, 인류는 외계 생명체로 향한다
·
[사이언스] 우주는 균일하지 않다! '대전제'에 도전하는 천문학자들
·
[사이언스] 외계행성계 생명 거주 가능성, 제임스 웹 관측 결과 공개 안 한 이유





















![[단독]](/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