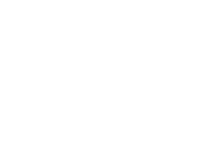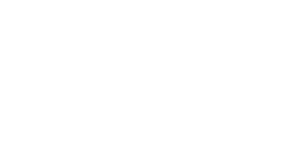[비즈한국]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위기 임산부 상담 및 긴급대응을 위한 상담전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들 제도를 두고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부모에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아동이 유기되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전에는 법 사각지대인 ‘베이비박스’ 이용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앞서 논의된 출생통보제로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정됐다.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보호출산한 임산부가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고,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 아동 유기 늘어날 것…아동의 알 권리도 침해”
이같이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을 고려한 ‘보호출산제’가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미혼모,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보호출산제로 ‘합법적인’ 유기가 늘어날 것이며, 위기 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애 아동은 아직도 입양 과정에서 비장애 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입양은 더욱 그렇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국내외 입양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 182명 가운데 건강 이상인 아동의 수는 40명으로, 전체 입양아동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국외 입양’의 경우 국내 입양보다는 상황이 낫다. 입양아동 142명 가운데 건강 양호 78명, 건강 이상 64명으로 엇비슷한 숫자다.

지난 1999년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텍사스주부터 시작된 ‘영아피난제(Infant Safe Haven Law)’는 현재 50개 주에서 운영 중이다. 미국 영아피난제 연맹 홈페이지에 따르면 31일 기준 1999년부터 영아피난제로 구출된 아이는 모두 4791명이다. 연맹은 ‘영향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구출된 아이가 최소 4505명이며, 같은 기간 불법으로 버려진 아이는 1608명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서술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점도 비판이 나온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는 성년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생모가 작성한 신청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에는 생모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이 담긴다. 하지만 생모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공개된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지난 22일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립준비청년 A 씨는 부모를 찾기 위해 인지 확인 소송 중이라며 출생정보를 볼 수 없는 일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A 씨는 “내 출생에 대한 정보다. 내가 그 정보의 주체다. 그런데 그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당사자가 알려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그 상황에서 ‘너는 익명보장이 아니면 죽었을 아이니 네가 엄마를 모르는 상황은 감수하라’는 것인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른들끼리 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감당하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서 아이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출산 전부터 위기 임산부에게 지원을 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의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검찰은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전수조사, 58%가 정보 공개 기한 어겼다
·
[대기업 총수 자택 공시가격①] 재계 1위 삼성 이재용 앞선 '2위 SK 최태원'
·
'5999원' 반복 결제에 카드 정지…신한카드 '더모아' 소송전 초읽기
·
'영상은 빨라졌는데 배송이…' 숏폼 탄 이커머스, 남은 숙제는?
·
통신 3사 '거대언어모델' LLM 개발,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