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더디게 발전했다. 국가 주도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제약 산업은 기초 과학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요즘, 우리나라는 ‘카피약 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즈한국’은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봄으로써 우리 제약 산업이 지닌 잠재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쳐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자명하다. 대기업의 바이오 분야 진출 소식이 끊임없는 이유다. 롯데는 바이오 사업을 신수종 사업이라고 보고 사내에 바이오팀을 신설했고,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식품 기업도 바이오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6년까지 매년 9% 성장해 5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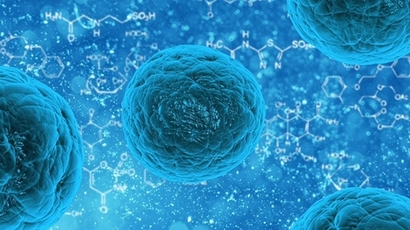
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벤처와 연구소가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신약 블록버스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합성 신약이 아직은 굳건하게 시장을 앞서나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바이오 신약이 시장을 역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과를 내리라 단언할 수는 없다. 바이오 사업만 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를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례를 참고해 성공 확률을 높일 필요는 있다.
#신약 집중하는 LG와 SK, 바이오 분야 결실이 관건
LG그룹은 제약업계에 처음 진출한 대기업으로 꼽힌다. LG는 1981년 럭키중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실을 신설하면서 제약업계에 진출했다. LG의 주된 관심사는 ‘신약’이었다. 1991년에는 최초로 국산 신약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했고, 2002년 지주사에서 생명과학 분야만 떼어내 LG생명과학을 설립한 이후에도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4000억 원의 R&D 비용을 집행했고, 2012년 출시된 국산 1호 당뇨신약 ‘제미글로’의 제품 개발을 위해 9년간 470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에 도전하겠다는 열망이 드러난다. 팩티브와 제미글로 등 신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모두 합성 의약품이다. 합성 의약품 신약을 개발하기 전 R&D를 중요시했듯, 올해 LG화학(2016년 LG생명과학이 LG화학에 흡수합병)은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R&D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 R&D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축에 속하는 한미약품의 한 해 R&D 비용 수준이다. R&D 이외에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을 사들이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LG화학은 당뇨·대사질환, 항암·면역질환 등 분야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설정하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의 과제는 성과를 더 내는 것이다. 지금도 시장 점유율이 41%인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24%인 관절염주사제 시노비안 등 바이오 의약품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부문 매출은 334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약 21조 원)의 1.6%에 불과하다.
SK 역시 제약업계와 연관이 깊다. 1987년 SK케미칼이 의약사업본부를 신설한 SK는 1993년 고 최종현 회장 지시로 제약(Pharmaceutical)의 영어 단어 첫음절을 딴 ‘P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제약·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SK케미칼(합성 의약품), SK플라즈마(혈액제제),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 SK바이오팜(신약개발), SK팜테코(위탁생산) 등 다섯 개 계열사가 사업을 이끈다.
특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SK가 회자하는 이유는 ‘신약’ 때문이다. 1999년 뇌전증 치료 신약 카리스바메이트를 존슨앤존슨에 기술수출 한 바 있는 SK는 신약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SK바이오팜은 1호 수면 장애 치료제 신약 솔리암페톨은 2018년, 2호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2019년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 1999년 SK케미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받은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는 2009년부터 생산실적이 없기는 하지만 1호 국산 신약이라는 타이틀은 유효하다.

그러나 합성 의약품에서만큼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게 과제다. SK바이오팜은 사명에 ‘바이오’가 있기는 하지만 허가받은 두 개의 신약을 비롯한 연구개발 진행 중인 약이 대부분 화학합성 의약품 위주로 짜여 있다. SK케미칼 역시 바이오 신약인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 등 합성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백신은 바이오 의약품이라 볼 수 있다.
#삼성, 위탁생산·복제약 지금은 괜찮지만…
삼성도 바이오에 관심이 많다. 바이오를 신수종 사업으로 보고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지난 8월에는 2023년까지 3년간 반도체·바이오·차세대 통신 등 미래 사업에 2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전략은 LG와 SK와는 다소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초기 임상 단계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개발(CDO),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위탁생산 하며 성장성을 입증받아, 올해 2년 연속 제약·바이오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주가도 90만 원대로 황제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성 면에서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 시장 규모가 커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나, 바이오 신약이 없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도 LG와 SK, 삼성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철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자회사 태평양제약 제약부문을 2013년 한독에 매각했고, 한화 역시 의약품 허가에 차질을 빚으면서 2009년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2015년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팔았다. 최근 바이오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롯데는 롯데제약을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철수했고, CJ 역시 33년간 가꿨던 CJ헬스케어를 매각한 바 있다.
결국 대기업은 ‘자본력’이 장점인 동시에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보고 뛰어들지만, 매출 크기가 다른 기업의 주력 사업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부 경영진의 반발이 잇따라 아예 사업을 접는다”며 “다만 제네릭(복제약)에 치중해 와서 사업 구조를 바꾸기 힘든 제약기업보다는 돈을 투자해 사람과 시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대기업 투자로 미국 바이오 신약 시장과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
[K제약 스토리]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6조 원, 정말 성과일까
·
[K제약 스토리] '한국판 화이자' 꿈꾸는 제약사 M&A 역사
·
[K제약 스토리] '천연두에서 백신 주권까지' 우리나라 백신의 역사
·
[K제약 스토리] 33호까지 나온 K-신약 '아직 갈 길 멀었다'
·
[K제약 스토리] '금계랍에서 BTS까지' 의약품 광고 변천사





















![[단독] 하이브, 민희진 재판기록 열람 제한](/images/common/list01_guide0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