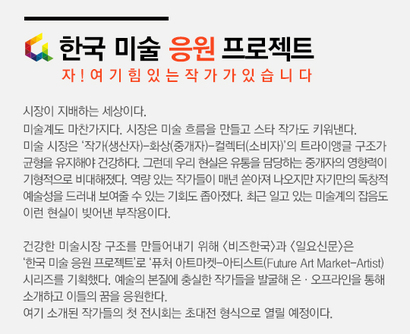
회화를 인간의 몸으로 빗대어 보면 형태는 뼈대, 색채는 혈액이다. 뼈대는 인간의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결정하기에 잘 보인다. 이에 비해 혈액은 액체 상태로 스스로는 일정한 형태를 갖지 못한다. 그 대신 뼈대가 만들어지는 데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뼈대가 만들어낸 인간의 몸이라는 정해진 그릇에 담긴다.
이쯤 되면 뼈대는 회화에서 형식을, 거기에 담기는 혈액은 내용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래서 회화에 담기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명쾌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틀을 깨고 자유로운 세계로 날아가게 하는 것은 색채로 표현할 수 있다.


김진숙은 이 두 영역의 경계선에서 독특한 형식과 감성의 회화를 보여주는 작가다. 시대의 흐름이나 입맛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다. 자기 정체성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에 어울리는 형식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작가다.
내용에 맞는 형식의 개발은 예술 본연의 임무다. 인문적 소양과 교양적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혜안을 단련해야 하며, 부단한 자기 연마를 통해 회화적 언어 습득에도 공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다.
김진숙의 회화 작업에서는 이런 태도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의 그림은 엄청난 노동의 결과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흡사 추상화처럼 보이는 작가의 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질서 속의 질서다. 무작위로 얹어진 것처럼 보이는 질감은 실은 고도로 계산된 구성의 결과다. 그렇지만 자연스럽다. 일정한 리듬과 율동으로 조율된 붓 터치에 의한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성이 엮어내는 것은 쏟아져 내리는 식물의 흐름이다. 그것은 군집으로 피어난 개나리 무더기거나 바람결을 타고 흐르는 수양버들, 때로는 봄빛에 흐드러지는 벚꽃의 군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진숙은 꽃을 그리는 작가는 아니다. 그가 꽃을 소재 삼는 이유는 자신의 감성을 담아내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꽃을 그리되 꽃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이다. 군집된 꽃을 고집하는 이유도 꽃으로만 보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추상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런 제작 태도의 결과물이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하모니로 드러나고 있다. 하모니의 힘을 믿고 꿋꿋하게 실천하는 김진숙의 회화가 기대되는 이유는 시류와 무관한 진짜 예술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단독] 헬기장은 어쩌고…노들섬 디자인 당선작 수정 불가피](/images/common/list01_guide02.png)
![[Gen Z 인사이트] 뷰티 플랫폼 '화해'가 맞닥뜨린 역설](/images/common/side01.png)
![[현장] 제약·바이오업계 찾은 노동부](/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