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아이가 전주에서 중증외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 나는 며칠 전 적나라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글을 썼다. 그리고, 제법 이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으며, 더 이상의 첨언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니 도저히 한 개의 글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어서 쓴다.
이 글은 ‘2살 난 소아가 중증외상을 입고 시스템의 미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접근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정책 입안자는 현재 이 시스템을 전부 갖춰 놓은 장본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반적인 의사 수급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 수가를 정해 놓은 것. 외상센터의 기준을 확립하고 지원금의 규모를 정한 것. 그리고 전원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전부 정책 입안자들이다.
이들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2012년 이전, 외상 환자에 관한 대우나 시스템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지금보다도 더 주먹구구식 처치에, 투자라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당시 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님의 일화가 화제가 되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가 국가적 어젠다가 되었다. 그전까지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그때야 정책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들도 그들이다. 늦은 일이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각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지원금을 보태기로 결정한다. 센터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정된 센터별로 80억 원에, 지원금이 매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22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었으며, 경제적인 논리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현장의 실태는 어떠했는지는 지난 글에 언급했으므로 이 글에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요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부재로 ‘2살 난 소아가 중증외상을 입고 시스템의 미비로 사망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한 입안자들의 접근 방식이다.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는 몰라도, 이 종합적인 문제의 책임은 전부 입안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편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2012년 전부터 의료계 전반에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2012년 이후에 외상센터의 기준을 확립하고 투자한 것도 그들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 하에서만 일하고 있었다.
그들이 투자하고 실태를 점검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는 어떠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지 파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어떤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몇 번을 되풀이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가 응당 취해야 하는 태도다. 나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언제나 입안자의 초점은 이렇게 맞춰진다. ‘우리가 220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기분이 나쁘다. 다시는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지겹도록 겪은 그들의 고착화된 습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서둘러 한 일은 놀랍게도 환자를 먼저 받은 전북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선정 취소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당시 전원을 받지 않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선정 취소까지도 더불어 고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함에서 시작된 ‘갑질’에 가까운 발상이다.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지원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매우 효율이 높은 방식이다. 강력한 통제 의료 안에서 당장 지원금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고,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서 입법자를 괴롭히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를 들어 전북대병원의 선정을 취소하고 원광대로 옮겼다고 치자. 원광대는 선례를 보았기 때문에, 환자를 보았을 때 일 순위의 가치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만들만한 사건만은 피하자’가 된다. 그렇다면 일견 현장은 조용해지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은 부재한 채 분위기는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만 말자’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가? 이게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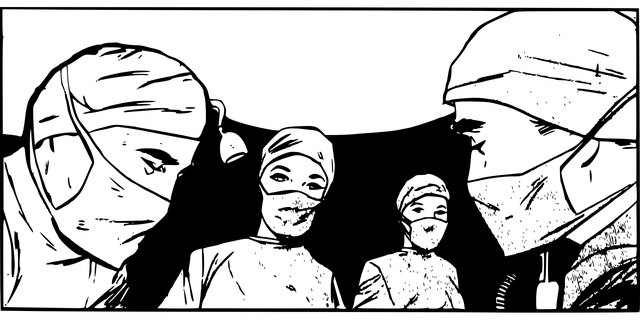
‘우리가 지원해줬음에도 환자를 제대로 못 보는 나쁜 놈들’이라고 일갈하는 방식. 허나 이는 별다른 시스템의 개선 방안이나 고민 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입법자들은 정확히 이런 방식을 답습한다. 문제의 근원은 돈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고,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 얼마만큼의 개선 사항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의 미비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가를 판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편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전국의 중증외상 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소재를 복기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아중증외상’에 대한 권역의료센터 선정 기준은 없었고, 전북대병원은 그 기준에 맞춰 일했을 뿐이다. 당장 전북대 병원의 선정을 취소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허공에 날리는 셈이며, 전라북도의 권역외상센터는 공석이 된다. 이는 자신들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며, 전라북도의 외상체계는 즉시 구멍 나고, 현장은 망가지고 퇴보하며 어김없이 다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 이상의 돈이 든다. 이를 분명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입법자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선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이어서 보는 사람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2012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외상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발전 과정에서의 실수는 인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입법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어떠한 고뇌도 없이, ‘사망자를 앞에 둔 사람’도 아닌 ‘사망자를 보고받은 사람’이, 서류상으로 근시안적이고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대책을 내놓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환자가 죽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다. 나는 이런 태도를 보며,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은 참으로 멀고도 요원하다고 느낀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 · ‘만약은 없다’ 저자
[핫클릭]





















![[단독]](/images/common/list01_guide02.png)
![[AI 비즈부동산] 25년 12월 2주차 서울 부동산 실거래 동향](/images/common/side01.png)
![[부동산 인사이트]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10대 결정적 장면](/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