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의 일이다. 야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다. 이것은 병원에 가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마땅히 수업을 대신할 교사가 없었다. 일단 야학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갔다. 내 증상을 들은 약사가 물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카레라이스 먹었습니다.” “카레 먹고 체한 거네.” 약사는 약을 지어주었다. 카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걸 먹고 체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난 일단 전문가의 말을 믿기로 했다.
밤새도록 배가 아팠다. 땀이 뻘뻘 나고 죽을 것 같았다. 이번에는 동네 병원에 갔다. 술기운이 있어 보이는 의사선생님이 물었다. “술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대장염이네요.”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주었다. 술 마신 지 6년이 넘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는다는 말인가!
또 하루가 지났다. 추석 전날이라 온 가족이 모여 추석상 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을 부치기는커녕 내 한 몸 간수할 수도 없었다. 택시를 타고 큰 병원에 갔다. 내과의사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내 왼쪽 배를 두드렸다. 뱃속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두뇌마저 흔들렸다. 내과의사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외과 과장에게 복막염 환자 있다고 알려주고 얼른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해요.” 그러고는 추석 쇠러 시골에 간다며 나갔다. 외과 의사가 왔지만 나는 말할 힘도 없었다. 간호사에게 겨우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쓰러졌다. 수술 후 새까맣게 썩어 있는 내장 한쪽을 보았다. 어쨌든 나는 살았다.
병문안을 온 친구와 친지들에게 한마디씩 들었다. 어떻게 약사 말을 믿느냐, 배가 그렇게 아프면서 어떻게 동네 병원에 갈 생각을 했느냐는 핀잔이었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에게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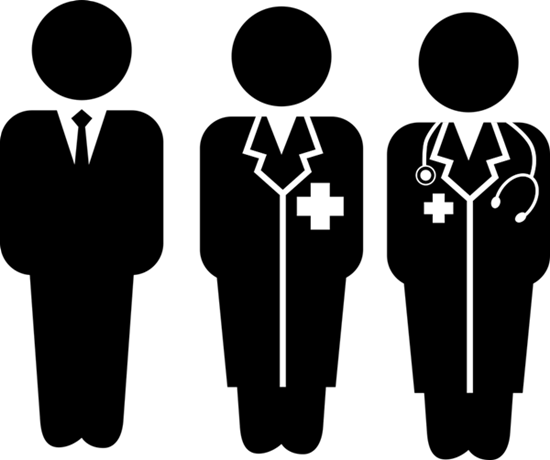 |
||
많은 환자들은 의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오랜 세월 병원 신세를 지셨다. 병실의 다른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 말고도 온갖 처방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약은 바깥에서 각자 구해온 이상한 것들을 먹는 분들도 계셨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보건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온갖 약재를 권한다. 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만 먹겠다고 하면 다들 혀를 끌끌 찬다. 모두가 의사 노릇하려고 한다.
나는 뭘 먹고 병을 고쳤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도 그 사람 말 안 믿는다. 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뇨병 처치를 위해서 매달 서대문보건소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아와 관련해서는 일산참좋은치과에 가고, 어깨나 무릎이 결리면 대명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뜸을 뜬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생화학자가 무슨 침이야?” 동창회에서 침 맞은 이야기를 했더니 모교에서 교수로 있는 동기는 어이없다면서 침이 치료효과를 내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뭐냐고 묻는다. 모른다. 그런데 침을 맞으면 적어도 내게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고 지금도 어깨 때문에 침을 맞고픈 심정이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아마도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이 얼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어쩌라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라는 말은 안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불명확성은 더 커졌다.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은 뻔하다.
이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피부과 의사들은 엄청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똑같은 시술을 피부과에서도 받을 수 있고 치과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좋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어려운 의사면허시험도 붙은 사람들인데, 그것도 무작정 혼자 공부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하는 시술인데 별 문제가 있겠냐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라면 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나눌 필요가 뭐가 있을까? 치과의사가 복막염 수술을 하고, 한의사가 임플란트 시술하고, 외과의사가 한약 조제하고, 약사가 침 놓고 뜸 뜨면 안 될 게 뭐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다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험성이 면허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환자로서 전문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 이번 판결로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환자가 불안에 빠지는 데는 대법원이 한몫했지만 더 큰 책임은 의학전문가들에게 있다. 그들은 의학이라는 자신의 전문가 영역을 사법부에 있는 의학 비전문가들에게 맡겼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모든 의료 영역의 전문가들이 직무 영역을 규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 살리려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복막염 수술하고 채 두 달이 되지 않아서 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그리고 넉 달 후 행군 중에 복막염 수술한 곳이 터져서 피와 고름이 쏟아져 나왔다. 놀란 교육장교는 나를 데리고 산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에 데리고 갔다. 의무병이 대뜸 말했다. “얼른 꿰매야겠네요.” “속이 곪아터졌는데 꿰맨다고 되겠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몇 시간 후 한의사 군의관이 왔다. 주머니에서 침을 꺼내는 게 보였다. “충성!” 절도 있게 경례를 한 뒤 나왔다. 그리고 50킬로미터를 더 걸어서 귀대한 후 병원에 가서 외과의사를 만났다. 전문가에게도 각기 다른 자기 전문 영역이 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bizhk@bizhankook.com




















![[단독] bhc, 해임한 박현종 전 회장 딸 아파트에 '가압류'](/images/common/list01_guide02.png)

